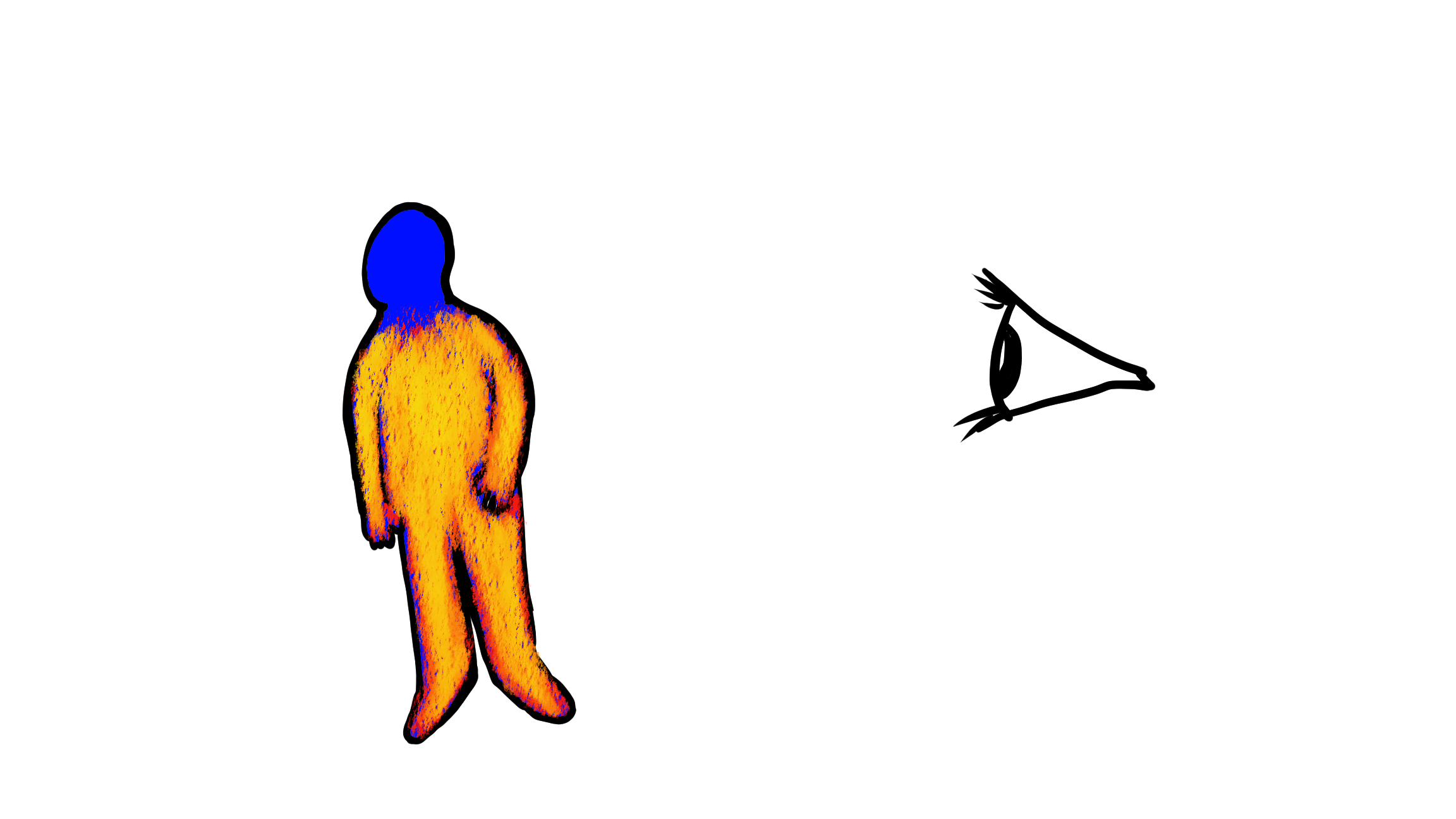스승님이 말씀하셨다.
“채워 넣는 것과 쌓는 것은 차이가 있다.”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바로 스승님께 여쭈어보지 않았다. 다행히 스승님은 나의 이해를 아시는 분이었다. 스승님은 손가락 하나를 펴서 나를 향해 말씀하셨다.
“무질서하게 쌓아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무언가에 채워 넣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내며, 그 결과가 무엇이든 사실이 되는 법이다.”
나는 스승님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간지럼을 느끼며 질문했다.
“만약 채워 넣은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죠?”
스승님은 나의 질문에 왼쪽 눈썹을 번쩍 들어 올리고는 씩 웃으셨다.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해. 그것을 채워 넣는 사람은 스스로 좋고 나쁘고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심지어는 스스로는 결과물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스스로가 모르면 누가 아나요? 신이 아는 것인가요?”
스승님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시며
“너 빼고 다들 너를 알아.”
나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 입이 무거워졌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요?”
스승님은 자기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알지.”
“그럼요 스승님을 알지요.”
“그것 말고도 많이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모르는 것도 알고 있어. 아무튼 내가 모르는 나의 모든 것 중 몇 개 정도는 네가 아주 잘 알고 있지.”
나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까는 저 스스로는 잘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스승님을 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일이야. 네가 아는 나는 어떤 것인지 아마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 몇 걸음 걸어도 알 수가 없을 일이지. 확실한 것은 너는 분명 나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야.”
나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다. 스승님의 말씀은 언제나 알 수 없는 것 중에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추려 내야 했다. 스승님은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구나. 하지만 나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나도 평생을 나 스스로를 보고 싶어 발버둥 쳤지만, 글쎄 그것이 시간을 들인다고 되는 일은 아니더구나.”
나는 스승님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다 질문했다.
“저에 대해 한 가지 사실도 모르는 사람도 저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너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지”
“제 이름을 몰라도요?”
“너를 아는데 네 이름이 무슨 소용이야?”
“그럼, 저를 부를 수 없고, 저를 두고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꼭 너를 불러야 하고, 너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너를 아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저를 안다는 건가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뭣 하러 따지겠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다는 것인가요?”
“채워진 것이 있으니까. 너에게도 분명 채워진 것이 있고, 너를 모르는 너를 보는 사람들은 채워진 것을 보고 너를 알게 되는 것이야.”
“잘 모르겠네요”
“그래 그렇지. 나도 모르니까.”
진짜 알 수 없는 일이다. 스승님과의 대화를 떠올리는 이때, 나는 그저 스승님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것 정도만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아는 게 없었다. 어느 일정 나이쯤 되면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다.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고,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 언젠가 덩그러니 서 있는 나의 머리통을 후려갈겨 주고 싶은 마음은, 어쩐지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