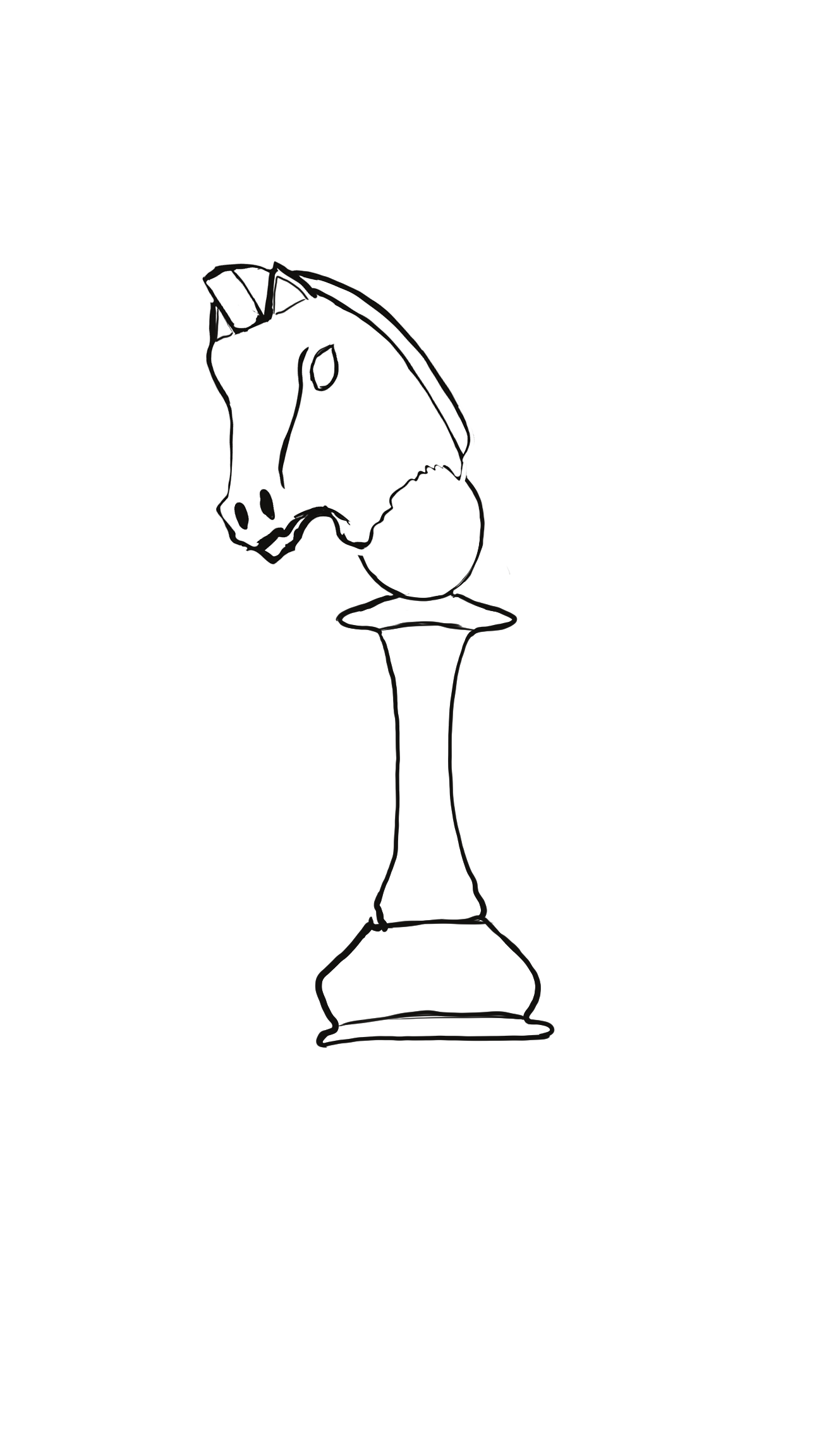16.위치
네 번째, 그놈은 알 수가 없는 놈이다. 그 이유가 가능성이나 기대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라면 좋으련만, 그런 것은 또 아니다. 네 번째는 그저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바보짓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가 말했다.
“너무 멀다는 거지.”
나는 그런 것인가 하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조금 더 길게 생각하려고 본격적으로 자세를 잡는데, 세 번째가 말하는 바람에 내 생각을 이어 갈 수 없었다.
“통하지 않는 것.”
그렇지 세 번째의 말에 생각할 것이 없이 확실했다. 바로 알아들었다. 맞다 네 번째는 늘 통하지 않는 짓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다. 그것참 바보 같은 짓이다.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나의 등 쪽을 쿡 찌르며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찔린 등짝을 손으로 살살 문지르며 두 번째의 날카로움은 어쩌면 손가락 끝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했다. 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지금 첫 번째의 나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네 번째의 행동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여기서나 첫 번째지 다른 곳에 가면 그렇지도 않다. 일곱 자리가 넘는 수가 되어 옆에 있는 놈의 손등에 난 털을 보고 나의 위치를 알아차리기도 하고, 언젠가는 떨리게도 ‘C’였다가, 어떤 때는 7번과 8번 사이에 어설픈 자리를 맡아 어색하게 웃음으로 때웠던 적도 있었다.
그중에 가장 난감하던 때는 내가 ‘나이트(Knight)’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은 ‘폰(Pawn)’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그때의 괴로움이란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아무렇지 않게 ‘나이트’에 맞는 규칙을 떠들어 대는 ‘폰’이라니. 나는 그냥 창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이트’라고 착각했을 때의 모습이 거대한 껍질이 되어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껍질은 내 몸속을 한참이나 빙글빙글 돌다가 입이나 그밖에 유사한 구멍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때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해서 생각하는 것으로도 몸 어디 한구석이 시큰했다.
아무튼 이럴 때가 아니지. 네 번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 중인데 처량하게 옛날 괴로움이나 들춰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고 보니 네 번째와 내가 대화를 한 적은 있던가. 그게 언제였을까. 분명 나는 네 번째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물론 네 번째를 무시하지 않았던 것은 배려나 인내 같은 것보다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혹시 자신의 위치를 착각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 그러니까 조금은 내 착각의 ‘나이트’ 시절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이런,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네 번째 그렇지. 네 번째에 관한 생각이다. 나는 분명 네 번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손을 흔들며 무언가를 말했었다. 아마 인사 정도였겠지? 그런데 그 후에 네 번째가 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도통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머리가 가려워서 긁적거리며 세 번째가 있는 곳에 팔을 뻗어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걔가 말했던가?”
세 번째는 내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지.”
아, 그렇구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 분명 네 번째는 무언가 말을 하기는 했던 것 같다. 나는 그럼 그때 뭘 하고 있었더라. 두 번째가 다시 나의 등을 쿡 찌르며 말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나의 등짝 어딘가가 멍이 들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 나는 두 번째의 날카로운 손가락이 거슬렸지만 일단 대답해야 했다.
“모르겠어”
두 번째는 손가락을 차갑게 벼려 번쩍 들어 올렸다. 나는 양손을 쫙 펼쳐 그의 손가락을 막으며 말했다.
“잠깐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
두 번째는 들고 있던 손가락을 거두었다. 나는 이제 네 번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생각해야 한다니. 사실 두 번째가 찔러 넣은 손가락의 싸늘함이 등으로부터 퍼져 귓등 뿌리까지 오싹했다. 나는 내 귀를 만지작거리며 순간 무언가를 생각해 냈다. 그러고 보니 네 번째는 아마 쉰여섯 번째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육천육백칠십삼번째였던가. 그건 대체 무슨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의 네 번째는 심각했다. 진지했고, 손으로 턱을 괴며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사람 같았다. 그때 생각하면 조금 속이 메스껍지만, 나는 알아낸 사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세 번째를 바라보고 네 번째가 쉰여섯 번째나 육천육백칠십삼번째 이야기하지 않았었냐고 물었다. 세 번째는 석상처럼 조용히 있다가 입만 굵게 움직여 말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었다니까.”
그렇지 쉰여섯 번째건 육천육백칠십삼번째건 그런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지. 네 번째 놈은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알아들어야 대화할 거 아냐. 그래도 생각해야겠지? 바보짓을 하는 네 번째에 대해서 말이다. 두 번째가 내민 손가락이 다시 내 등에 쑥 들어 왔다. 나는 이번에는 인상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번째의 냉담함이나, 세 번째의 무신경함 같은 거에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 고통과는 무관하게 입을 비틀고 말했다.
“그냥 두자.”
나는 등을 문지르며 그것도 좋다고 말했다. 물론 고통이 왼쪽 어금니까지 전달되는 이때 반박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세 번째도 재빠르게 대답했다.
“그것밖에 없네.”
나는 정말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생각은 했던 것인가? 그저 ‘그 방법’이라는 게 머릿속에 꽉 차게 들어와 여유가 없는데.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지. 네 번째는 언젠가 가까워진다면 말할 수 있겠지. 아니면 말할 수 없거나. 확실한 것은 두 번째가 찔러 넣은 고통이 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